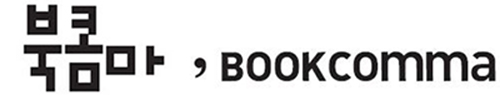민주화보상법,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
1.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등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.(2014헌바180 등)
*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: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'재판상 화해'로 간주해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
__결정 이유: "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."
"배·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."
다만 "보상금 등엔 적극적·소극적 손해(재산적 손해)에 대한 배·보상 성격이 포함돼 있다"라며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'정신적 손해'에만 제한했다.
2. 또 이날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상 소멸시효(민법 제166조 1항 등)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.(2014헌바148 등)
__결정 이유: "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"
"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 구금 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, 사후에도 조작 은폐를 통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"
___이로써 과거사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민간인 집단 희생 피해자들은 과거서 정리 단계에서 진실 규명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
1.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.
2. 2013년 12월 대법원은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'재심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'로 해석했다.
'현재의판결,판결의현재1 > 2018년판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확정 판결 (0) | 2018.10.03 |
|---|---|
|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2조(기지국수사, 휴대폰 위치추적수사), 헌법불합치 결정 (0) | 2018.06.29 |
|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,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 종류 조항은 헌법불합치 (0) | 2018.06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