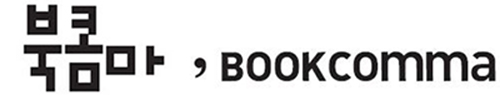형기를 마친 아동 성폭력범, 상습 성폭력범, 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‘보호수용제’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
법무부가 9월 3일 입법예고한 '보호수용법 제정안'
__보호수용의 대상을 줄였다: 살인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, 13살 미만자에게 성폭력을 가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사람
__집행 여부 심사: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, 그리고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심사한다. 총 2번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.
__가출소 심사: 보호수용 집행 중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심사를 실시한다.
근로를 원하는 수용자에게는 작업을 부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준다.
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.
수용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 교환,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다.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.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.
이중처벌 아닌가
__형기를 마친 사람을 재수감해 격리 수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처벌이다.__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.
__이름만 바꿨을 뿐 보호감호제와 다르지 않다: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 도입됐다가 2005년 폐지될 때까지 대표적 인권침해 제도였다. 9년 만에 부활을 시도하는 셈. 보호감호제는 절도범과 사기범 등에게도 적용되었다.
__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호하다.
'초점1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, 인터넷 환경에 맞는 문장 부호로 보완 (0) | 2014.10.30 |
|---|---|
| 공개 소환 대상, 공적 인물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 예외적으로 실명과 지위가 공개되며, 포토라인에 선다 (0) | 2014.08.29 |
|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과 지정일, 공휴일에 대하여 /설날과 추석 연휴, 어린이날 (0) | 2014.08.25 |